성장하는 2세대 주재원 (1990 년대)
1990년대에 이르로 한국은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했다. 이 시기의 2세대 해외주재원은 단순히 정해진 기간 내에 주어진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1세대 해외주재원과는 달리 일정 기간의 임기를 부여받고 해외로 파견되었다.

역활도 해외 영업 및 마케팅으로 변화되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위해 해외시장 및 고객을 발굴 했다. 진출 분야도 건설 및 무역업에서 조선, 전자 및 자동타 등으로 확장되었다. 파견지도 미국, 일본, 중동 지역에서 유럽, 동남아시아, 북미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해외주재원으로서의 경력은 1세대 해외주재원과 마찬가지로 귀임 후 큰 경쟁력이 되어 고급관리자나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97년 이전의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3세대 주재원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1997년 발생한 한국의 IMF 구제금융신청은 한국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많은 인력을 퇴출시켰고, 해외조직도 국내 본사의 영향을 받아 핵심 진출지 외의 해외법인 및 지사의 해외주재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00년대이후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그들의 해외조직 및 해외주재원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에 흡수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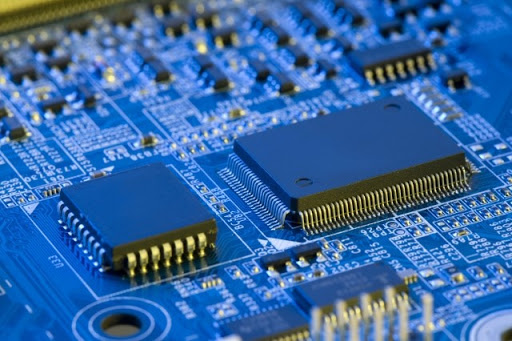
2세대 해외주재원들이 주로 전자 및 자동차산업에서 파견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해외주재원들은 IT, 조선, 유통산업으로 파견 산업군이 보다 다양화되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면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새로운 세대의 중요한 역활이 되었다. 또한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과 중국 주변국인 동남아시아로 생산거점이 이동되면서 해외주재원의 파견지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위주로 개편되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경영 규모를 축소하면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기 때문이다. 3세대의 해외주재원들은 1, 2세대의 해외주재원과는 달리 프로젝트 관리,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외에 해외 공장의 생산 및 품질관리 직군의 엔지니어 등이 본격적으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4세대 주재원 ( 2000년대 후반 ~ 현재)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었고, 해외조직과 해외주재원의 수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은 앞다투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동서남아시아로 진출했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들도 북미 및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이에 따라 4세대 주재원은 생산 및 품질관리를 주로 담당하던 3세대 주재원과는 달리 브랜드 관리, 경영관리, 매장 설립 등 다양한 현지 경영을 맡게 되면서 멀티플레이어 역활을 요구받게 되었다. 파견지도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자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는 산업군도 IT, 조선, 유통산업에서 미디어, 광고 및 홍보, 자원개발, 디자인, 중장비 산업 등으로 확장되었다. 개발도상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던 생산 전략도 생산뿐 아니라 제품을 직접 현지에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주재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파견지는 다각화되었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해외주재원들과 달리 해외 근무에 대한 불만도 가속화 되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 이유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출하지 않았던 나라로의 진출이 많아지면서 파견지 자체가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과거 해외 근무 경험자가 적어 해외주재원이 임원 승진의 지름길 또는 핵심 인재로서의 특권으로 인식된 데 반해 요즘은 그 수가 늘어 해외 근무 경험 자체가 경력 개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귀임 후 경력 승진의 부스터 역활을 했던 3세대까지의 주재원들과 달리 해외주재원 경력에 대한 프리미엄 상실이 가장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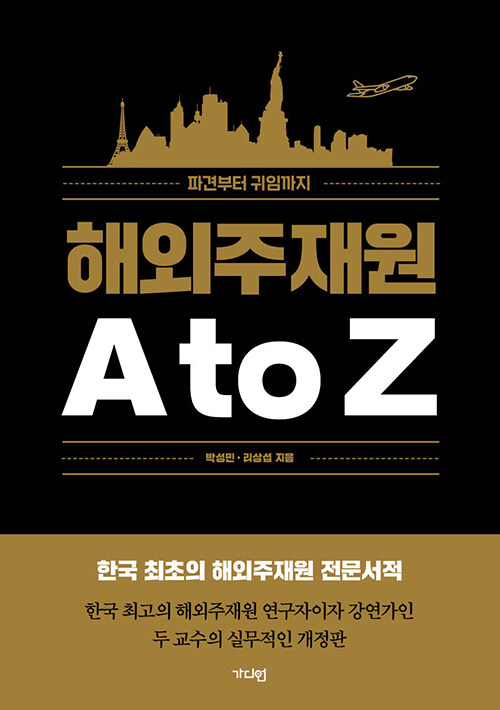




댓글